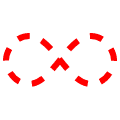축구처럼 다수 인원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 겨루는 단체 종목은 결국 분위기 싸움이다. 상대를 고려한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야 말로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선결조건이다. 분위기가 좋다는 건 화기애애하다는 의미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팀 전체가 하나된 자신감을 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로 가기 전 한국에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스웨덴은 생각만큼 강적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리고 스웨덴 베이스캠프인 러시아 겔렌지크로 날아가 닷새간 훈련 모습을 지켜봤다. 겉으로는 여유있어 보이나 베이스캠프 입성 전 A매치 무득점이 이어지며 자국 언론의 뭇매를 맞은 흔적이 보였다. 여기에 예기치 않은 ‘뻥 뚫린 훈련장’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스웨덴 내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야네 안데르손 감독이 한국에 ‘스파이설’ 등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발언과 행동으로 선수단 분위기를 다잡는 느낌도 받았다. 생각보다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이었다. 뚜껑을 연 스웨덴은 정말 우리가 딱 예상한 그 수준이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페널티킥(PK) 결승골을 내주고 패할 정도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기 종료 호루라기가 울린 뒤 기자석에서 느낀 감정은 실망보다 허무에 가까웠다.
속된 말로 너무 쫄았다.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 발이 느린 수비. 스웨덴의 특징이 경기 초반 모두 드러난 상태라 적어도 후반에는 이에 대응하는 변화를 기대했다.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 강점(높이)만 의식한 채 실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멕시코 훈련캠프를 취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지내던 중 만난 전한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우리 선수들이 실수에 대한 부담을 버렸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바로 그 지점이다. 기자는 유소년 축구를 담당하면서 독일, 잉글랜드 등 선진 리그 유스팀의 경기를 몇 차례 현장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 나라 유소년과 가장 다른 것을 느낀 게 있다면 기량이 아닌 태도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경기 중 어이없게 공을 빼앗기면 맹렬하게 달려들어 다시 공을 탈취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대부분 벤치를 먼저 쳐다본다. 지도자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팀 분위기는 선수 개인의 심리, 정신력이 모여 형성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선수들은 경기 중 스스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성인 선수로 성장하면서 창의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한다. 당연히 팀으로 뭉쳤을 때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량으로 국내 최고 선수가 모이는 국가대표팀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 스웨덴전 PK를 내주고 눈물을 쏟은 김민우나 몇차례 패스 실수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은 장현수가 다음 경기에서 얼마나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결국 극복해야 한다. 이게 국가대표의 정신력이다. 어릴 때부터 축적된 태도를 단번에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이들에겐 동료가 있다. 큰 무대를 경험한 유럽리그 소속 선수, A매치 출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등이다. 동료의 피드백 힘을 믿는다. 멕시코는 스웨덴보다 더 강한 상대이기에 경기 중 더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잃을 게 없다는 정신으로 공에만 몰입했으면 좋겠다. 눈치보지 말고 한 번 미친척 뛰면 설령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만의 축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장면이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