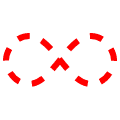미국 내 韓국적자 106만명 거주…뉴욕·LA 급속 확산세 불구 동포 정책 나몰라라
뉴스포커스
양국정상 통화 때도 재외국민 보호요청 없어
현지 주재원 보낸 韓기업들도 사태 대응 비상
마스크등 보호장구 공수 등 선제적 대책 시급
미국 내 106만명에 이르는 한국 국적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경기도 수원시 전체인구(119만명)에 맞먹는 106만명의 한국 국적자가 체류 중인 미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수립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 한국동포는 무려 254만6982명으로 이 중 미국 시민권자인 148만 2056명을 제외하고 기업 주재원,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체류자는 전체의 42%인 106만4926명에 이른다.
▶우한 등'전세기 소환'이 전부
그간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발단으로 뒤늦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막느라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중국 우한과 이탈리아 등 심각한 발발지역에서 입국 희망자들을 파악해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전세기 대책'이 사실상 선제 수단의 전부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3월 초부터 코로나19 진단테스트 역량을 강화한 뒤 최악의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인 뉴욕시를 중심으로 방대한 감염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뉴욕주 내 한국동포는 42만1222명 정도다. 이 중 한국 국적자는 19만9999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최대 한인동포 밀집지역인 LA의 경우 무려 67만6709명의 한국 동포가 살고 있다. LA 전체 동포 중 한국 국적자는 25만918명으로 LA와 뉴욕주 두 지역만 합산해 45만917명의 한국민이 점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를 목도하고 있다.
신문은 미국에서만 경기도 수원시 전체인구(119만명)에 맞먹는 106만명의 한국 국적자가 체류 중임에도 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수립 움직임은 아직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지 한국인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부 수동적 조치외에 정작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 공수 등 선제적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신문은 가장 큰 불안요소로 현 청와대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감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꼽았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전화통화를 했지만 미국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등 한국동포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불의의 주재원 사고 누가 책임?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브리핑 내용을 보면 총 23분의 대화에서 ▲의료장비 지원(트럼프 대통령 요구) ▲미FDA 신속승인(문 대통령 요구) ▲한국의 코로나19사태 호평(트럼프 대통령) ▲한·미 통화스왑 체결 평가 ▲주요 20개국(G20) 화상정상회의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 관련 대화만 오갔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비현실적인 마스크 규제완화 대책도 미국 내 직원과 가족과 친지를 둔 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기업이 미국에 파견 중인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건·수술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싶어도 발송인이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한정돼 보낼 수 없다. 설령 직계존비속이 보내더라도 한 달을 기준으로 최대 8장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에 가장 빠른 항공 특송인 '국제특송(EMS)'을 이용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한 달이 소요된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 정부만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미국 현지에 한국 직원들을 파견 보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주재원 안전 관리도 발등의 불이다. 현지 주재원들이 미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등을 대비해 법적 배상 문제를 포함해 사전 보호조치 등 포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소한의 보호장구인 마스크 지급마저 정부 규제로 회사 차원의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