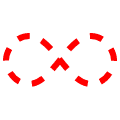해고 부추기는 美 수퍼 부양책…4달간 주당 600불 추가 지급 합치면 ‘묵직’
뉴스진단
기업·업체들 부담감 없이 인원 절감 나서
코로나 불안 일부 노동자 “출근보다 선호”
“복직 보장없고, 수혜 끝난후 고통 본인 몫”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효한 2조2000억 달러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기업에 해고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업급여 챙겨주기에 나서자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이번 부양안에는 연방정부가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7월31일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고용국(EDD)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1주 평균 최대 450달러, 39주:기존 13~26주)을 합치면 계산상으로는 해고 직원은 최고 4200달러 까지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에선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으로 원래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인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부양안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약 12만5000명의 직원 대부분을 일시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제프 게넷 최고경영자(CEO)는 “해고 결정에 부양책이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사무용 가구회사 스틸케이스, 피트니스클럽 체인 이퀴녹스 역시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며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를 거론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일부 노동자들도 실업급여 수령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문화가 확산된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고 뒤에 복직한다는 보장이 없고 실업수당 수혜 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수입이 없이 다시 직장을 찾아 다녀야 한다는 부담은 온전히 본인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