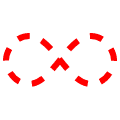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시즌을 치르고 있는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은 구종 부자다. 대분류 상으로는 대략 4가지 구종을 던지지만, 세분화하면 패스트볼 하나만으로도 4가지 구종 이상 구사한다.
지난 15일(한국시간) 밀러파크에서 치른 밀워키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도 7이닝 동안 안타를 3개만 내주는 짠물 피칭으로 시즌 평균자책점을 0.63으로 끌어 내렸다. 투구수 87개가 증명하듯 김광현은 삼진보다 맞혀 잡는 피칭에 집중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야수진이 탄탄한 측면도 있지만, 맞혀 잡아야 투구수를 절약하고, 그래야 긴 이닝을 소화해 불펜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자신의 투구철학을 빅리그에서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광현은 “어릴 때는 무조건 강하게 던져 삼진을 잡아내는 게 좋았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야수들의 리듬감, 불펜진의 체력 보완 등을 위해 공 한두개로 아웃카운트를 만드는 게 팀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투수와 타자의 대결은 타이밍 싸움이다.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무조건 빼앗아야 한다. 맞혀 잡는 재미를 느낀 김광현이 구종 부자가 된 배경이다. 포심 패스트볼 하나로 코스뿐만 아니라 구속, 볼끝 변화 등으로 타이밍을 빼앗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김광현이 밀워키전에서 던진 포심은 우타자 몸쪽으로 예리하게 파고드는 컷패스트볼 궤적을 띄었다. 이날 포심 최고구속은 148㎞까지 측정됐는데, 커터성 포심은 143㎞ 정도였다. 타자가 포심 타이밍에 스윙을 하면 빠르기도 한데다 몸쪽으로 휘어 들어오니 손잡이 쪽에 맞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배트가 부러지거나 매우 약한 3루 땅볼이 자주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김광현이 아직 보여주지 않은 구종들이 있다는 점이다. 투심 패스트볼을 싱커처럼 던지기도 하고, 10㎞ 이상 구속차를 주는 이른바 ‘직체’(포심처럼 던지지만 궤적은 체인지업)도 던진다. 체인지업, 커브와 함께 쓸 수 있는 포크볼도 숨겨둔 상태다. 커브가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지는 궤적을 갖고 있다면, 김광현이 던지는 포크볼은 바깥쪽으로 흘러 나가는 110㎞대 변화구다. 팔색조로 빅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류현진(33·토론토)만큼이나 다양한 구종과 구속 차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현은 “올해는 빅리그 적응기라고 생각한다. 타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루틴이 깨졌다. 정상적인 시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오히려 덕분에 나는 빅리그에 적응할 시간을 벌고 있다. 내년이 진짜 승부일텐데, 올해 잘 적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퀵 앤드 슬로’ 전략을 더욱 세분화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빅리그 연착륙 그 이상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김광현의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구속을 조금 더 끌어 올려야 한다. KBO리그에서 뛸 때처럼 153㎞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어야 무빙 패스트볼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 김광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구속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광현이 95마일짜리 패스트볼을 던지는 시점이 본격적인 빅리그 정복 시점이 될 전망이다.
zzan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