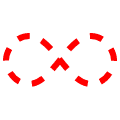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김준철]
나의 오래된 시계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그리하여 끝내 멈춰 버린 심장과 식어 버린 열정 사이에서 허덕이며 비루한 호흡을 할딱인다 잠수하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별다를 것 없는 어제와 오늘,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간단없이 깔딱거림의 지루함을 이겨 내며 결단코 완전히 어느 쪽을 택하지 않는다 무던히 반복의 힘을 빌려 아직은 연명하고 있음을 검은 눈알 번들대며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다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어제와 오늘은 다시 오늘과 내일을
꼼지락거리는 나의
너의
죽지 못한 오래된 시간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우린 또 12월을 만났다.
코로나 이상으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시간이 흐름인 것 같다. 아차 하는 사이 시간은 저만치 끝자락을 내비치며 앞서간다.
커다란 일상의 변화가 어느새 익숙해지고 이젠 이전의 일상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에 와 있다. 매일 뉴스에 귀 기울이고 몇 명이 아프고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하던 일도 시들해졌다. 무엇을 계획했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조차 아득하다. 내가 원치 않은 일상의 커다란 파도에 무기력하게 휩쓸려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더 씁쓸하게 만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엘에이는 짙은 안개로 끈적하게 흐르는 하얀 강 같다. 랭커스터에서 일가족 5명이 살해당했고 14살짜리 아이가 18발의 총을 맞고 죽었고 15살 아이가 무차별 총질을 했다는 단신을 들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도통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2년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린 다시 2022년이라는 숫자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아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루라는 발자국을 더욱 신중하고 깊게 내딛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