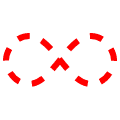1990년대는 스포츠신문들의 전성기였다. 한창 낙양의 지가를 올릴 때였다. 야구시즌이 끝난 겨울철 주 메뉴는 해태 타이거스 스타 플레이어들의 연봉 협상이었다. 이른바 마라톤 중계식의 연봉 협상 보도를 했을 정도다. 요즘이야 수 억 원 단위 연봉 협상도 조용하게 이뤄져 타결 소식만 보도된다.
성적이 좋은 구단은 늘 연봉 협상이 최대 현안이었다. 워낙 구단 제시액과 선수 요구액의 차지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겼었다. 당시에는 음주 협상도 많았다. 사무실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장소를 음식점으로 옮겼다. 사적 얘기까기 곁들여 2,3차 협상을 벌였다. 기자는 밤에 벌어지는 협상도 기다렸다.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얘기다. 비능률적인 연봉 협상이다. 유독 해태 타이거스의 연봉 협상이 주를 이룬 이유가 있다.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탓에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았다. 그 중심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오리 궁뎅이' 김성한 등이 있었다. 해태 선수들은 한국시리즈 우승 공로를 연봉으로 보상받고 싶었다.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다. 2021년 연봉조정신청을 제출한 13명 가운데 LA 다저스와 탬파베이 레이스는 각각 2명씩이다. 가장 많다.
해태 구단은 선수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90년대 해태 선수들만큼 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본 경우도 드물다. 해태 출신 선수들이 기자들과 유난히 가까운 이유가 바로 연봉 협상에서 비롯됐다. 당시는 구단과 선수 관계가 갑과 을이었다. 선수 입장에서는 기자들을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야 했다. 언론플레이다. 연봉 인상 이유를 지면에 반영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태에는 상고 출신의 노주관 사장과 꾀돌이 이상국 단장(KBO 총장)이 버티고 있었다. 연봉 협상은 늘 구단의 승리였다. 선동열, 이종범을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치솟는 연봉을 부담할 수 없어서다.
메이저리그도 예전에는 구단과 줄다리기를 펼쳤다. LA 다저스 마운드의 쌍두마차 샌디 쿠팩스와 돈 드라이스데일은 연봉이 타결되지 않아 1966시즌 스프링트레이닝에 불참한 적이 있다. 1965년 팀을 월드시리즈 정상으로 이끈 쿠팩스는 26승8패 2.04, 드라이스데일은 23승12패 2.77을 기록했다. 결국 구단은 쿠팩스에게 연봉 12만5천 달러, 드라이스데일에게는 11만 달러 연봉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MLB 최고 연봉은 뉴욕 자이언츠 외야수 윌리 메이스의 12만5천 달러였다.
해태나 LA 다저스의 협상 과정은 요즘의 연봉조정신청에 해당된다. 미국 스포츠에서 연봉조정신청도 메이저리그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20년 작고 후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된 선수노조위원장 출신 마빈 밀러가 이룬 업적이다. 현재 프리에이전트로 천문학적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노사단체협약을 최초로 일궈낸 밀러 덕분이다.
탬파베이 레이스 1루수 최지만(29)이 16일(한국 시간) 2021년 연봉조정신청을 했다. 13명이 연봉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최지만은 245만 달러(27억357만 원)요구, 구단은 185만 달러(20억4147만 원)를 제시했다. 60만 달러(6억6210만 원) 차이다. 2월 최종 청문회(Hearing)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지만은 2016년 4월에 데뷔해 활약에 비해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 이유있는 연봉조정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