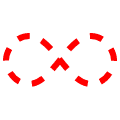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팀의 공통점은 선수 한 명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치·스포츠 전문 통계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26일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하나 올렸다.
2000년 이래 월드시리즈(WS) 우승팀을 살폈더니 선수 1명의 연봉이 해당 구단 연봉 총액의 20%를 넘은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현 마이애미 말린스)가 그런 유일한 팀이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말린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포수 이반 로드리게스의 연봉(1000만 달러)은 구단 연봉 총액의 22.2%에 달했다.
한 선수에게만 전체 선수 연봉의 5분의 1 이상을 준 셈이다.
올해 WS를 제패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최고 연봉자는 투수 데이비드 프라이스로 3000만 달러를 받았다. 보스턴 전체 연봉 총액의 12.8%였다.
같은 3000만 달러인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연봉은 전체 구단 연봉의 31.5%를 차지했다.
파이브서티에이트의 자료를 보면, 2000년 이래 WS 우승팀 중 최고 연봉자의 몸값이 전체 연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사례는 2013년 보스턴의 존 래키로 10.3%였다.
올해 연봉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구단 연봉의 20%를 넘은 선수는 아리에타, 잭 그레인키(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25.8%),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24.7%), 미겔 카브레라(디트로이트 타이거스·24.0%), 에릭 호스머(샌디에이고 파드리스·22.3%), 라이언 브론(밀워키 브루어스·22.0%), 마이크 트라우트(LA·20.5%) 등 7명이었다.
이들 중 올해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은 이는 브론이 유일하다.
매니 마차도, 브라이스 하퍼와 같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거쳐 거액의 다년 계약을 바라는 슈퍼스타들에겐 분명 좋지 않은 뉴스다.
구단들이 앞으로 특정 선수 한 명에게 큰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애리조나가 스토브리그에서 그레인키 트레이드에 적극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각각 10년간 2억5200만 달러, 13년간 3억2500만 달러에 계약한 알렉스 로드리게스, 장칼로 스탠턴의 사례를 곁들였다.
이들은 각각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애미 말린스와 천문학적인 계약을 한 뒤 계약 3년 만에 나란히 부자 구단 뉴욕 양키스로 이적했다.
한 선수에게만 너무 많은 돈을 쓴 텍사스와 마이애미가 여력 부족으로 다른 곳에 전력을 보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많은 돈을 받는 선수가 구단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었다.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이런 역사적인 사례는 메이저리그가 슈퍼스타 한 명으로 완전히 팀이 바뀌는 NFL, NBA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점을 알려준다고 분석했다.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 않고, 전반적인 전력의 균형 상승이 훨씬 중요한 게 야구다.
아무리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한 경기에 많아야 4번 타석에 들어서고, 최고의 투수라고 해봐야 선발 로테이션에 따라 닷새 만에 등판하는 게 고작이므로 한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NFL, NBA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