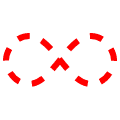6월 30일에 개막한 윔블던 테니스 대회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로 유명하다.
선수들이 착용하는 의류와 신발 등은 모두 흰색이어야 한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2일(한국시간) 올해 윔블던 개막을 앞두고 디아나 슈나이더(러시아)의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5위 슈나이더는 경기할 때 두건을 착용하고 뛰는 것으로 팬들에게 잘 알려졌다.
2004년생인 슈나이더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윔블던에서 두건을 벗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흰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슈나이더는 익스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땀을 잘 흡수하는 재질의 원단을 찾아서 머리 모양에 딱 맞는 두건을 맞춤 제작한다"며 "흰색으로 된 천 재질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윔블던에서 3회전까지 올랐던 그는 "원단을 고르고, 제 머리에 맞게 맞추는 작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6월 30일에 1회전을 치른 슈나이더는 흰색 모자 등 다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코트에 나서 우치지마 모유카(72위ㄱ일본)를 2-0(7-6<7-5> 6-3)으로 제압했다.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역대 윔블던 개막일 기준 최고 기온의 폭염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2회전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불만 대신 윔블던 대회 분위기가 좋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슈나이더는 "다른 메이저 대회와 비교하면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푸른 잔디와 흰색 옷을 입고 뛰는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즐겁고 멋있다"고 말했다.
또 윔블던 대회 기간도 아니었던 올해 3월에는 에마 라두카누(영국)가 연습 세션에서 분홍색 옷을 입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작년 우승자부터 예선 통과 선수까지 모두 흰색 옷을 입는 것은 훌륭한 평등 원칙"이라며 "선수가 주목받고 싶다면 (패션이 아닌) 자기 경기력을 통해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올잉글랜드 클럽의 설명을 전했다.
포브스는 "윔블던의 흰색 옷 전통은 1870년대부터 시작됐다"며 "당시에는 땀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고, 흰색 옷을 입으면 땀이 덜 난다고 해서 그런 전통이 자리 잡았다"는 테니스 명예의 전당 사서인 메레디스 리처즈의 설명을 전했다. 하지만 '흰색'이 의무화한 것은 1963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