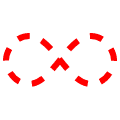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세상만사]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 독일 광부, 독일 간호사
많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1960년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땅 독일로 향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있었다.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이국땅에서 고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2월 21일 광부 123명이 서독으로 처음 출국했다. 그해부터 1977년까지 광부가 7천936명 파견됐고,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1천57명이 독일에서 일했다.
■ 애국가에 터진 눈물
파독 광부와 간호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박 대통령 내외는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광산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00여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깊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 적셨다. 애국가 마지막 구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아예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박 대통령 내외도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
■노동자 수입하는 한국
이제 세상이 바뀌어 오래전부터 한국도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과 돌봄노동까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생산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춘희 작가가 쓴 책 <깻잎 투쟁기>를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깻잎 한장에도 이주노동자의 고된 손길이 있었다.
■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저출생과 고령화로 한국에는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동남아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 경제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외국 노동력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그나마 동남아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아직은 '일하고 싶은 나라'로 선호한다고 한다.
■ ‘지게차 조롱’ 국민적 공분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당국이 부랴부랴 손을 걷고 나섰다. 이달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변을 당했다.
■ 법과 제도, 인식 바뀌어야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는 없던 일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좀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깻잎 투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