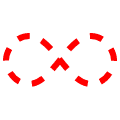사탕 한 개만 먹어도...
어느 컴맹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면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단다. 아들 방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다. 그러나 정말로 수십억의 세균들이 우리 몸 안에서 꿈틀대고, 기어 다니고 움찔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염려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세균들의 95%는 해가 없고 단지 나머지 5%만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없을 것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음식을 소화할 수도 없고 식물들은 자라지도 못하는가 하면 쓰레기들은 썩지도 못하고 머지않아 이 지구는 엉망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30억 년 이상이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나 해야 할지.
과학자들도 이러한 미생물들이 언제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모른다. 운석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물방울 속에서 단백질의 시작으로 생겨났는지 모른다. 어찌됐든 대부분 우리에게 이로운 미생물들은 여러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밀접하다. 태풍에 관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약 3,500가지의 발효음식에도 관계한다. 조리사 역할도 한다. 맥주, 포도주, 간장, 소세지, 초콜렛 등에 말이다. 그런가 하면 약사로, 정원사로, 관리인으로도 일해 준다. 낡아 보이도록 만드는 청바지의 탈색에도 작용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미생물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 경우도 있었다. 1791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3만여 명의 군대를 하이티에 보냈다. 노예 출신의 독립 반란군 대장 투상 르브투르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안에 황열병이 프랑스군을 거의 전멸 시켰다. 할 수없이 나폴레옹은 군대를 철수하고 하이티의 독립을 인정했다. 황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하이티에 독립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일차대전 때는 영국에서 전함의 대포탄을 만드는데 화학기술이 필요하자 관리 로이드 죠지는 유태인 미생물 화학자 바이스만에게 도움을 청했다 거절당했다. 바이스만은 박해를 피해 러시아로 탈출했는데 후에 죠지는 영국 수상이 되었고 바이스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된 역사도 있다.
아무튼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는 적어도 몸의 세포 수보다도 100배가량 많다고 한다. 겨드랑이에 기생하는 박테리아는 이곳에서 나는 땀방울과 섞여서 심한 냄새를 나게 한다.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나는 것이다.
구강 내에서는 세균이 주로 혀나 치아 주위에 많은데 침에 의해 쉽게 씻겨나지만 수백만이 항상 남아 상주한다. 캔디 한 조각을 먹으면 불과 5분 안에 치아 주위에 무언가 코팅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구강 내에 있던 박테리아의 한 종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이 박테리아를 뭉치게 해서 플라그를 만들고 충치를 유발하게 한다. 우리 몸무게의 약 10%는 이러한 미생물의 무게 때문이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열심히만 씻으면 10%의 몸무게가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살 빼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까? 불가능하다. 씻어버린다고 해도 불과 20분 내에 두 배로 회복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손은 자주 씻고 양치질은 자주 해야 한다. 특히 지금 사회적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2015-07-07 03: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