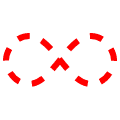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누드'의 아내
'누드'하면 뭐니 뭐니 해도 '플레이보이'지(誌)다. 세기의 호색한이라 불리는 휴 헤프너가 성 생활에 대한 '킨제이 보고서'에 깊은 감명을 받고 '18 이상 80세의 남자에게 의미 있는 잡지가 되겠다'는 선언과 함께 1953년에 창간했다.
첫 호 겉표지에 당시 인기 절정의 섹스 심벌이었던 마릴린 먼로의 누드를 실은 후 지난 62년 간 남의 것을 엿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을 대표하는 성인잡지로 자리잡아왔다.
그렇지만 플레이보이는 '여성 누드 사진을 싣는 잡지'라는 선입견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편으론 수준 높은 읽을거리와 콘텐츠를 갖춘 잡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것은 최고 유명 미녀들의 누드만 실은 게 아니라 존 레논이나 마틴 루서 킹 목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심지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유명인사들의 칼럼과 인터뷰, 진보적 사회평론은 물론 철학에서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읽을거리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차별적인 콘텐츠 덕이다.
나름대로 완전 포르노와 다르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육체적 성(性)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도 내적인 지적 호기심도 제공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누드의 대명사 플레이보이가 이제 더 이상 누드를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섹시하고 매혹적인 그러나 13세 관람가 수준의 노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람들의 관음증이 옅어져서가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란다.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사방 천지에 공짜 포르노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싱거워진 잡지를 어느 누가 돈 내가며 사 보려하겠는가? 심지어 몰카 까지 용이한 세상에 말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벗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벗은 알몸에 대한 엿보기 욕망을 충족하고픈 사람들의 은밀한 관음증은 발가벗은 몸뚱이만큼이나 그 위에 걸친 겉치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명품 치장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지위 등 남이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기 보다는 외형과 소유를 한눈에 훑어보고 가늠 하는데 재빠르다. 그러니 겉치레에 외모 지상주의 까지 법석 떠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떠오른다. 오랜 결혼 생활로 감정이 무뎌진 탓인지 아내는 따스한 시선 한번은 고사하고 언제나 텔레비전에 코 박고 떨어질 줄 모르는 남편이 얄미웠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관심을 좀 끌어 보기위해 예쁘게 꽃분단장을 하고는 남편 앞을 지나가 봤다. 투명인간 보는 듯했다. 이번에는 잠자리 옷을 입고 살포시 실루엣을 남긴 채 지나갔다. 역시 미동도 없다. 약이 바짝 오른 아내는 아예 벌거벗은 채로 더 가까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반응은 역시 마찬가지. 화가 치민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께서 하시는 말씀,'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옷은 좀 데려 입지 그랬어!'하더라나?
누군가 우스개로 지어낸 얘기겠지만 아내의 몸에 생긴 세월의 나이테를 구겨진 옷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도 재빠른 겉치레 관음증 탓일 게다. 그렇지만 상대가 다른 이였더라면 걸친 것마저 꿰뚫어 보고 싶은 관음증을 십분 발휘하지 않았을까?
2015-12-08 04: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