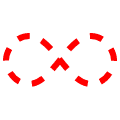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국민은 거대한 야수(beast)’이며, 대중은 ‘변덕스럽고 감정에 휘둘리며,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이지만, 제도적 견제없이는 그들의 욕망과 열정이 정부를
혼란과 독재로 이끌 수 있다는 미국 건국자인 해밀턴의 경고다. 대중은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쉽게 선동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중의 취약성을 파고들어 권력을 획득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이성적 판단과 참여를 전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중은 복잡한 정책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순한 구호와 감정적 호소에 쉽게 반응한다. 트럼프는 이를 간파하고, 정책 설명 대신 직설적 언어와 선동적인 MAGA?구호를 통해 대중의 무지를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했다.
그는 선동 전략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구축했다. 이 구도 안에서 인종, 이민, 성소수자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대중의 극단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정치의 양극화 속에서 지지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분노와 열망을 정치에 직접 투영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등장은 디지털 포퓰리즘이 현실이 된 셈이다. 그 사례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이며, 이는 대중의 야수적 본성의 극적 발현이었다. 그는 재집권 이후에도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제도와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의회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갇혀있고, 사법부조차 중립성을 포기하면서 헌법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그의 권력 폭주를 거부하는 ‘No Kings(왕은 없다)‘같은 사회적 저항과 풀뿌리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민사회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이민자 추방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사회 통합의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다. 미국이 ’소수의 다수(minority-majority)‘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다’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사회 전체의 균열로 확대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민사회의 고통을 외면하면 결국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대중과 선동가의 영합인 ‘폭민 정치(Mobocracy)’를 미국의 건국자들은 250년 전에 심히 두려워했다. 메디슨은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없다’고 했고, ‘행정부는 권력이며,
불(fire)같아서 위험하다’고 워싱턴은 경고했다. 제퍼슨은 ‘자유로운 정부는 신뢰가 아니라 경계심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나온 방안이 연방헌법이다.
그러나 선출된 지도자는 ‘헌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확대로 자아도취와 자기과시의 유혹에 잘 넘어간다. 파킨슨의 끊없는 ‘팽창 법칙’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건국자들이 보여준 대중의 분노와 지도자의 욕망을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의 실천이다. ‘노예생활이 오래되면 자기 발의 족쇄를 자랑한다’는 로마 속담이 있다. 폭압적인 현실을 깨닫고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민 개개인이 인식하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도와 시민 모두가 욕망에 끌려가는 폭민의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