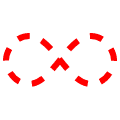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트리거>는 사적 복수를 위해 총격이 난무하는 사회를 그렸다. 가상의 서사지만, 그것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됐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 부품을 모아 제작한 '고스트 건'이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니다. 불법 개조 총기 제조, 온라인 총포류 거래, 해외 부품 밀반입까지 총기 관련 범죄가 다양화하고 있다.
흉악범죄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선다. 흉기를 든 범인 앞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수하며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총을 꺼내 선제적으로 제압할 것인가.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부터 과잉 대응이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 총을 꺼내기 전보다 꺼낸 후가 더 두려운 까닭이다. 총기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 법적 책임, 여론의 질책, 오남용 논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이다. "논란이 생기면 윗선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현장의 불신도 여전하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첫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 5월 경기 파주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현장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에 익숙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총기 사용을 주저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훈련은 '공포탄→테이저건→실탄' 단계별 대응을 실제 시나리오 속에서 반복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는 위기 상황에서 언제 총기를 사용하고, 언제 자제해야 하는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찰 총기 사용 실태를 보면 접근 방식이 사뭇 다르다. 미국은 경찰관 전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발포 기준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영국은 정반대다. 대부분의 경찰관이 일상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무장 경찰은 특수부대에 한정돼 있다. 일본은 경찰관 대부분 근무 시 권총을 휴대하지만, 발포는 극히 드물다. 총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경찰이 일상적으로 무장하지만, 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총기 사용을 관리한다. 한국도 우리 현실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앞서 광주경찰청이 6월 흉기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의 행위를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판단한 사례는 의미가 크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총기 사용 권한 확대에는 책임도 따른다. 경찰관들은 총을 쥔 손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언제 쏘고, 언제 쏘지 않을지, 그 미묘한 경계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 판단력을 키우는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