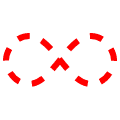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달라도 한참 달라…" 선거 대하는 스타들의 자세
[이·슈·진·단]
한국 - 정치발언 득보다 실, '꼬리표'되기 십상
미국 - 자신의 정치적 성향 '꺼리김 없이' 표명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미 양국이 소란스럽다. 하지만 선거 정국을 바라보는 각국 엔터테이너들의 온도차는 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할리우드 스타들과 달리 한국 연예인들과 정치 사이에는 큰 담이 쌓인 듯하다. 사실상 폴리테이너가 사라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연일 스타들의 정치적 발언이 화제다. 배우 조지 클루니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지지를 표명했고 팝가수 케이티 페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이 클린턴을 추종한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굵직한 스포츠 스타를 조력자로 두고 있다. 유명 프로 레슬러인 헐크 호건은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복서 출신인 마이크 타이슨은 "비즈니스를 하듯 미국을 경영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배우 조니 뎁(오른쪽)은 대학 강단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버릇없는 사람(Brat)"이라 비판했고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성토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내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스타를 보기 힘들다. "대선과 총선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정 후보 지지는 고사하고 정치적 발언조차 삼가는 편이다. 이는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 때문이다. 사석에서 곧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한 영화계 인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의 정치적 발언이 '낙인'이 돼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며 "이런 선입견은 나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목소리를 낮춘다"고 토로했다.
한국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특수성도 연예인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요인이다. 스타들에게 주로 일거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트'개념이 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매니지먼트는 소속 스타의 대외적 이미지와 사생활까지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특히 후폭풍이 강한 정치적 발언은 '경계 대상 1호'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던 몇몇 스타들이 인기를 잃고 연예 활동이 크게 축소된 전례도 연예인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한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는 "광우병 파동 당시 한 여배우가 SNS에 소신 발언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던 일이 기억나는가"라며 "정치적 다양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한국 정서상 대중의 고른 지지를 얻어야 하는 연예인들은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