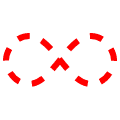인플레에 표심 악화하자 경제·세금보다 낙태권 이슈화
WP "불법 낙태약 수입 규모 갈수록 확대…건강 위협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 잡기 실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집권 민주당이 미국 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낙태권 이슈를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두에 나섰다. 그는 18일 워싱턴DC 하워드 극장 연설에서 "낙태권이 중요하다면 투표해야 한다"며 "낙태권 성문화법을 첫 법안으로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연방법에 임신중절 권리를 명시하겠다는 공약으로 낙태권을 옹호하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민주당 의회·주지사 후보의 TV 광고를 살펴보면 경제·세금 문제보다 낙태권 문제를 더욱 내세우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6월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구성된 보수 성향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진보 성향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시위가 한동안 계속됐다.
민주당이 낙태권 이슈로 '선거 프레임'을 만들고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 중간선거 표심잡기 경쟁에서 공화당에 다소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조사에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49%)는 응답이 민주당 투표(45%)를 앞섰다.
반면 낙태권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앞선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 승부수로 낙태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운 이유다.
실제 이런 전략이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표심에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WSJ은 소개했다. 특히 핵심 부동층으로 꼽히는 교외 지역 거주 여성들의 지지세가 낙태권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가시화하자 낙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공화당 정치인들도 혹시나 유권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일부 여성들이 건강을 해칠 위험에도 멕시코 등 해외에서 불법 낙태약을 수입·복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내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무료로 낙태약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한 낙태권 옹호 단체가 또 다른 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의약품을 확보, 미국으로 보내주면 미국 내 자원봉사자들이 '중간공급책'으로 나서 우편 등으로 임신부에게 최종 전달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 처방 없이 임의대로 약을 먹는 방식은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감시를 피해 배송한 의약품이 실제 낙태약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다. 어느 날 배송된 의약품이 꿈에도 예상치 못한 마약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이 전달하는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미소프로스톨 등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10주 미만 임신부에게 낙태 용도로 허용한 것이지만, 10주를 훨씬 넘은 임신부들도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실제 이 약을 배송받은 한 커플의 사례도 전했다. 임신부의 남자친구는 전달된 의약품이 낙태약이 아니라,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한다.
이런 걱정에도 임신부는 "무섭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약을 먹는다. 이 임신부는 욕조 안에서 진통을 겪다 결국 낙태를 했다고 WP는 전했다.
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