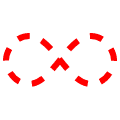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인&아웃]
► 대왕대비 문정왕후의 섭정
조선 제12대 국왕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승하하자, 중종의 차남인 경원대군이 12세로 즉위했다. 그가 명종이다. 당시 중종의 계비(繼妃) 문정왕후는 왕실 최고 어른이었다. 문정왕후는 명종의 모후이며 대왕대비로서 스스로 전교를 내려 수렴청정을 결정해 약 8년간 권력을 장악했다. 그녀는 친정 윤씨 일가를 요직에 앉혀 불교계를 중흥시키고 승직과 관직을 주물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구체적인 거래 증거는 없지만, 외척과 측근의 매관매직 행위를 비호·방조한 것은 부패 정치의 전형이었다.
명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간 4대 암군(暗君) 중 한 명인 정덕제(무종) 시절 황귀비 위씨도 마찬가지였다. 환관 유근(劉瑾)과 짬짜미해 중앙·지방관직 인사를 돈과 맞바꾸었다는 기록이 <명사>(明史)에 전한다. 황제와 침실을 공유한 총희(寵姬)의 속삭임은 곧 인사권이었다. 그 대가로 금은보화가 흘러들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브라힘의 생모이자 섭정이었던 코셈 술탄도 재상과 총독직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술탄의 여성들 거주공간인 하렘은 황실 내부의 정치·권력 투쟁의 장이었다. 하렘의 여성들과 궁정 관리들은 매관매직의 중개상 역할을 했다.
► 무력했던 제도적 견제 장치
한국 정치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뒤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경호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고 대통령실 홍보 자리 제안을 했다는 정황도 있다. 대선 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직과 정부 발주권, 공천이 명품과 시계, 여론조사를 매개로 거래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배경은 권력 사유화에 있다. 우선 권력 핵심 뒤에는 비선 세력이 기생한다. 공식 인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 가족·친척·측근을 매개로 한 인사 거래가 가능한 구조가 굳어진다. 제도적 견제 장치는 무력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대통령 부부가 인사권·공천권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면, '절반의 권력'은 이권과 청탁이 오가는 장터가 된다. 권력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측근이 돈을 챙기고 이를 비호하면 매관매직과 다를 바 없다.
► 반복되는 한국 정치 흑역사
향후 특검 수사는 김 여사의 뇌물수수·인사개입 의혹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사유화될수록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패는 제국과 왕조, 민주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맹독'이다. 대통령 부인의 매관매직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 정치문화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흑역사가 될 것이다. 제도적 견제 강화와 인사권 투명화 없이는 '관직 장사'라는 유령은 시대를 달리해도 좀비처럼 부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