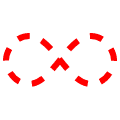기후변화 막는 보루역할, 올 1∼6월 서울 면적 6.6배 규모 열대우림 훼손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곳곳 벌목…뭉텅뭉텅 대규모로 잘려 나가는 나무들
길 쪽엔 수풀로 '위장'…헤치고 들어가면 참상 고스란히
(마나우스·리우프레투다에바[브라질 아마조나스주]=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내가 장담하는데, 2∼3년 후에 여기 다시 오면 저 나무들도 없어졌을 겁니다"
시뻘건 땅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무수한 나뭇가지를 무심코 바라보던 알란 페레이라 데 카스트루 씨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멀리 울창한 숲을 가리키며 가까운 미래를 덤덤하게 예언했다.
카스트루 씨는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핵심 도시인 마나우스 토박이다. 군 복무 기간 5년을 빼면 쭉 이곳에서 살았다.
주변 웬만한 길은 손금처럼 훤하다는 그와 함께 차량으로 아마존 분지 주변을 살피는 과정은 그런데도 그리 쉽지 않았다.
우선 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다.
바닥 곳곳이 움푹 파인 비포장 흙길은 시속 20㎞ 이상의 속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날씨 역시 만만치 않았다.
체감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한낮 더위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온몸을 감쌌다.
열대우림 특유의 습한 기운을 물리치기도 힘들었다.
강 물기를 머금은 바람만으로도 어느 한 곳에 물웅덩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였다.
"아마존에서 이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던 카스트루 씨는 이제부턴 생각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며 앞장섰다.
정글 같은 길로 발을 들인 그는 성인 키만 한 수풀을 손으로 서걱서걱 헤쳐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엔 이곳이 아마존 맞나 싶은 광경이 갑자기 펼쳐졌다.
분명 나무들이 있었을 법한 곳이 마치 공터처럼 뻥 뚫려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꽤 멀리까지 보였다.
면적은 족히 축구장 하나 정도는 되는 듯했다.
바닥엔 잘리고 베인 나무들의 잔해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뿌리째 뽑혀 쓰러져 빨갛게 변한 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전쟁터의 시신처럼 처참했다.
강렬한 햇볕에 노출된 흙바닥은 불그스레하게 굳어가는 모습이었다. 풀 한 포기도 보기 힘들었다.
역설적으로 그 주변엔 10m 넘는 키 큰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묘한 경계를 이뤘다.
카스트루 씨는 "아마존의 슬픈 현실"이라며 "오랫동안 잘 보존된 숲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마나우스에서 북동쪽 리우프레투다에바로 향하는 약 80㎞ 거리 곳곳에서 목도한 벌목 현장만 10곳이 넘었다.
그 규모는 다양했는데, 직접 걸음으로 확인한 곳은 축구장 절반(약 3천500㎡) 크기는 됐다.
특이한 점은 벌목 장소 대부분 수풀로 가려져 사람이 다니는 길에선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원한 지역 주민은 "자른 나무를 트럭 등으로 실어나른 뒤 벌목 흔적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더 많은 나무를 베어 가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이자 거대한 탄소 흡수원인 아마존이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막는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설명인데, 정작 그 핵심인 나무들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잘려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올 1∼6월 사이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 면적이 3천987㎢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면적(605㎢)의 6.6배 규모다.
올해 1월(430㎢)과 2월(199㎢)의 경우에는 각각 월별 역대 최대치의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과 방화 등 아마존 우림 훼손 원인은 다양하다.
이 중 벌목은 언제든지 제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마나우스로 되돌아오는 길, 이곳저곳 팬 도로를 12시간 넘게 달린 카스트루 씨의 2013년식 승용차에서는 정비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차량 창문 너머로는 대형 공장 건설을 위해 기초 공사가 한창인 현장이 보였다.
"저곳에도 한때는 나무가 가득했다"고 카스트루 씨는 말했다.
wald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