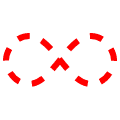이·사·람 / 암투병 중 86세 '이 시대의 지성'이어령 교수 '천재시인 이상'특별 강연
"생명은 정보와 의미에 있는것
영원함 없이 모두 죽는 세상서
의미 남기는 것이야말로 중요"
"절망도, 암흑도 글로 쓸수있어
그래서 행복한 죽음을 맞을 것
한발짝 더가게 계속 글 쓰겠다"
"병과 친해지면서 살고 싶어서
'투병'대신'친병'이라는 말 써
항암치료 안받고 여생 음미해"
"죽음에는 생물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등 여러 양태의 죽음이 있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런 모델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내 생각이 문화유전자처럼 퍼져가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 석좌교수가 암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17일 저녁 천재 시인 이상(1910~1937)에 대한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강연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이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이상의 집'에서 마련한 유물공개행사의 축하강연 형태로 열렸다. 86세 고령의 이 교수는 연초에 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지만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대신 3~6개월마다 건강체크만 하고 있다.
▶'한국론'12권 구술 집필중
이 교수는 "내가 환자처럼 병원에 누워 있었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도 못 나왔을 것"이라며 "병과 친해진다고 해서 투병이라는 말 대신 친병이라는 말을 썼더니 병도 요즘에 친해져서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은 정보와 의미다. 영원한 것 없이 누구나 죽는 세상에서 의미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이 문화유전자처럼 퍼져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카뮈가 '내게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쓸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병중에도 그는 '한국론'을 구술로 집필하고 있다. 12권이 목표지만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래도 쓴다. "내가 비록 세상을 떠나도 생각이 끝없이 문화유전자처럼 퍼져간다면 이런 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글 쓰는 사람은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을 글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암흑이라고 해도 암흑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는 "생명은 숨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보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목숨은 다해도, 정보는 살아남기 때문이다.
"생명은 바로 의미의 세계예요. 신라의 뜻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절대로 멸하지 않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는, 누구나 죽는 삶 속에서 뭐를 남길 것이냐? 의미를 남기는 것이죠."
암 투병 중인 그는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 병과 함께 살자고 태도를 바꿨더니, 병과도 친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항암치료는 받지 않고 있다.
"객기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는 자연히 수명을 다해 세상을 뜨나, 병으로 세상을 뜨나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나이 많은 사람은 (암 진행이) 더디니까. 참고 견디면서 글 하나 더 읽고, 창문 한 번 더 열고 풍경을 보는 것, 그게 의미가 있어요. 물론 내 얘기고, 젊은 사람들은 의사 지시 따라서 항암 치료 꼭 받으세요.(웃음)"
▶"삶의 중요한 것들은…"
피곤한 듯하던 이 전 장관은 강연을 시작하자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힘을 더 얻어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내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일한 것을 두고 나라에 공헌했다고들 하는데, 이런 건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장관도 내 일생에서 2년밖에 안했어요. 지금은 올림픽 굴렁쇠나 알지, 내가 '공간기호론'을 썼다는 건 몰라줘요.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공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것, 알아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지요."
그는 젊은 시절 '우상의 파괴'를 써서 기성 문단을 뒤흔든 사람이 아니라, '이상론'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가 이상을 되살려낸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이상은 젊은 나이에 객사한 폐결핵 환자지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작품만으로 권력과 돈을 남긴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1930년대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새로움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공헌이지요.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름 내는 사람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별로 공헌한 게 없지요. 뒷골목에서 숨어서 일한 분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끌고 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