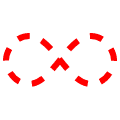성모 대성전에 안장된 교황…장식 없는 묘, 더 깊은 울림
무덤 일반 공개 사흘째지만 여전히 긴 추모 행렬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은 그의 삶처럼 소박했다.
아무 장식 없는 비석에 프란치스코의 라틴어 표기 '프란치스쿠스'(Franciscus)만 새겨져 있었다. 태어난 연도, 재위 기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무덤 위에는 그가 생전 가슴에 걸었던 철제 십자가 복제품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는 역대 교황과 달리 순금 십자가 대신 투박한 철제 십자가를 늘 가슴에 지녔다.
무덤 양옆에는 화초가 균형 있게 놓였고 가로로 꽃장식이 앞을 단정히 감싸고 있었다. 바티칸 시국의 국기 색깔인 노란색과 흰색 꽃들은 이곳이 교황의 무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어두운 경내에서 따뜻한 빛깔의 조명이 무덤과 무덤 위의 십자가를 은은하게 비췄다.
참배객의 발걸음은 교황의 무덤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영어와 이탈리아어가 뒤섞인 표현으로 'No stop, prego'(멈추지 마세요, 부디)라고 외쳤지만 참배객들은 그 앞에서 멈춰 성호를 긋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안식을 기도했다.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을 사진에 담았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29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안장된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성모 대성전)을 찾았다. 교황의 무덤이 일반에 공개된 지 사흘째였고, 평일 오전이었기에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대기 줄은 성모 대성전 왼쪽 벽을 타고 계속 이어져 성모 대성전 뒤편의 '에스퀼리노 언덕의 광장'에선 여러 줄로 나뉘었다. 기온은 21도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햇빛이 강렬했다.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차분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40여분을 기다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 앞에 설 수 있었다. 전임자들과 달리 세 겹이 아닌 홑겹 목관에 몸을 누였던 교황은 무덤마저도 간소하고 소박했다.
교황은 '가난한 이들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따르겠다며 역대 교황 중 누구도 갖지 않았던 그 이름을 선택했다. 교황은 그 즉위명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세상과 교회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 애썼다.
지난 26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엄수된 장례 미사에는 난민과 죄수, 성소수자, 노숙인 등이 초청받았다. 장례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의 관이 성모 대성전으로 운구됐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이들은 수감자와 노숙자였다.
교황은 늘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념을 지켰고, 그 신념이 소박한 무덤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듯했다.
프랑스에서 온 앙투안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늘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며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소박한 무덤이 교황의 인품과 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려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니라 대중적인 성모 대성전을 안장 장소로 선택한 것도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도하기에는 이곳이 훨씬 좋은 곳 같다"고 했다.
아버지인 니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박한 교황이었다"며 "그와 닮은 분이 다음 교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무덤을 참배하고 나왔을 때 성모 대성전 앞을 시티투어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다. 성모 대성전은 로마의 관문 기차역인 테르미니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 사람 걸음으로는 테르미니역에서 약 20분 거리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보다 가깝다. 웅장함과 그 위용으로 주눅들게 하는 성 베드로 대성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대중적인 곳이기도 하다. 장지 선택마저도 그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