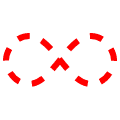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칼럼-세상만사]
김학천/치과의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다. 언제나 그렇듯 선수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 하나가 모두 감동의 드라마다. 해서 양궁을 비롯해서 펜싱과 사격 등에서 빛나는 한국선수들의 투혼과 인간승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리우'는 1502년 포르투갈의 항해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 대서양에서 좁은 입구로 연결된 만을 강으로 잘못 알고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라고 외친 데서 유래됐다.'1월의 강'이란 뜻이다.
'리우'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다. 나폴리, 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의 하나로 꼽히는 것 말고도 세계적 휴양지 코파카바나 해안과 30m 높이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예수상도 코르코바도 산에 자리하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보사노바와 삼바 그리고 지구촌 축제라 불리는 카니발도 있다.
그런 브라질에서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아날로그 식으로 그 막을 올렸다 해서 화제다. 경제침체 때문에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연출하는 특수효과는 적었다. 그러나 다양한 인종, 문화와 삼바로 상징되는 신나고 화려한 춤과 음악은 그 이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아날로그 감성이 돈으로 치장하는 디지털보다 낫다는 것을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했다.
누구나 국제경기가 벌어지면 자국을 위해 열심히 응원한다. 그러다가 간혹 나라사랑의 열정이 지나쳐 자칫 배타적 민족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대적 감정을 넘어 한 목소리로 열광하고 응원하는 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승리 그리고 부당함에 저항하고 정의를 이루어 내는 숭고한 정신에 감동하고 전율을 느끼기 때문일 게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등장한 '난민팀'에겐 더욱 그렇다. IOC가 올해 초부터 세계 난민캠프에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찾아내고 훈련시켜 선수 10명으로 만들어진 120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첫 '난민팀'이다. 집도, 팀도, 국기도, 국가도 없는 이들은 비극에 직면한 전 세계 난민에게 인류애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난민 몇이 탈출하던 중 고무보트에 물이 들어오자 수영하면서 보트를 밀어 지중해를 건넌 유스라도 그 중의 한명이다. 그녀를 비롯한 난민팀들이 입상권에 들었다는 소식을 아직 없지만 이들이 보여준 진지함과 페어플레이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흑인으로서는 사상 처음 수영에서 우승하고 눈물을 보였던 시몬 마누엘과 기계체조에서 우승한 또 다른 흑인선수 시몬 바일스에게 열광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이 소녀들이 알려준 인종적 장벽과 차별 그리고 편견을 깨고 선사하는 '희망'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꼭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각개의 의지와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결합하는 참으로 건강한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위대한 인류애의 발로 때문이라 믿어진다.
인간 본연의 감성도 디지털로 꾸며지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아날로그 때문이라서가 아닐까? 모든 선수들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