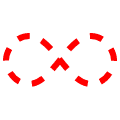P5 정상 중 미국만 총회 참석…중·러에 영·불까지 불참
안보리 마비·제재 무력화·진영대결 격화에 현안 논의 '헛바퀴'
유엔 사무총장 "난 권력도 돈도 없다" 자조 섞인 한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지구촌 난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토대로 구축된 유엔이 심각한 무기력을 노출하고 있다.
국제공조의 구속력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총회는 존재 이유까지 위협받는 형국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는 참석자 명단에서부터 맥 빠진 모습이 드러난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5) 정상들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유일하게 총회에 나온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 정상마저도 석연찮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의 불참은 올해 유엔 총회의 다수 의제를 고려할 때 총회의 위상에 대해 시사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올해 현안에는 기후변화 대처와 같은 글로벌 난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전, 아프리카 쿠데타 도미노 등도 포함돼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의 안보, 아프리카에 대한 장악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이 같은 변수에 무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 때문에 이들 국가 정상의 불참 배경에는 총회 논의 자체의 효용에 대한 저평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총회에 140개국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이 참석하지만 안보리 마비 속에 결국 말잔치만 난무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존재감 유지에 고전하는 유엔이 이번 총회가 공회전하면서 더 무력해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전, 아프리카 쿠데타 등 여러 분쟁에서 주변에 기웃거릴 뿐 실질적 중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 담당 국장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유엔의 처지가 지금 암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의 외교가 벼랑에 더 다가섰고 주요 강국의 긴장이 유엔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근원인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행동에 나설 책임과 권한을 있는 핵심기구로 해결책을 강제할 수단을 갖는다.
P5와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보리에서 P5는 모든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 같은 비토 권한 때문에 최근 진영대결 속에 논의된 안보리 의제는 다수 그대로 좌초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 5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다른 13개국의 찬성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우크라이나전 해결책에 대한 결의안을 침공 이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 비호하는 국가인 시리아, 말리 등에 대한 제재나 지원안도 속속 무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서방과 갈등이 악화하자 남반구 개발도상국을 규합해 진영구축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보리의 분열과 유엔의 무기력감 확산에 유엔을 이끄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일단 현실을 시인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안보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에 "권한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그는 "사무총장은 권력도 돈도 없다"며 "하지만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다른 자리에서는 일부 정상 불참을 들어 유엔 회원국들을 단결시키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떠받칠 유엔의 존재감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안보리 대수술론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 남발에 맞서기 위해 상임이사국을 늘리고 거부권 규정을 바꾸는 등 안보리 개편안을 이번 총회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