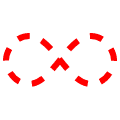외국인 범죄 늘자 통역 수요 급증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 그늘
"영어 못해요."
지난 7월 어느 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유치장에서 프랑스인 A씨는 프랑스어 통역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영어로 영장 집행 절차를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영어를 못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었다. 다급한 경찰이 민간 통역사를 구해 전화로 통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버텼다. 결국 이튿날 아침 프랑스어 통역사를 경찰서로 불러 통역을 맡긴 뒤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피의자인 사건에선 수사가 통역사 일정에 달려 있을 정도"라고 했다.
한국 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수사·재판하기 위한 '통역 전쟁'이 한국의 경찰서와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96명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이들이 '모국어로 말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경찰이나 법원이 통역사 구하는 데 애를 먹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통역 요원은 4375명이다. 하지만 일선에선 "통역 인력이 부족한 데다 주로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엔 민간 통역 업체에 'SOS'를 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중에는 중국·캄보디아·라오스 출신이 많은데, 통역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법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2014년 3751건에서 지난해 6382건으로 10년 만에 70%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58개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은 총 5198명(작년 11월 기준)이다. 재판은 한 건당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도 복잡한 탓에, 통역까지 해야 하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작년 7월 실시간 통역 시스템인 릫법정 통역 센터릮를 도입했다. 법정 한쪽에 TV 모니터를 설치하고, 서울에 있는 통역사가 외국인 말을 실시간으로 들은 뒤 통역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