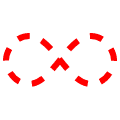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앞으로는 더 넓은 곳에서 실컷 놀 수 있기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이승연 기자 = 이태원 참사 나흘째인 1일 서울광장과 녹사평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늦은 오후까지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퇴근길 직장인과 귀가하는 학생, 산책길에 나선 가족 등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분향소를 찾았다. 쌀쌀해진 공기 탓에 시민들은 손을 비비거나 외투 앞섶을 여미면서 자신의 차례가 오길 기다렸다.
"구해줬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마스크 벗고 숨쉬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해줄 걸. 나는 앞에서 잡아줘서 살았는데 정작 아무도 구해주지도 못했다. 그게 너무 미안하다."
생존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서울광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오열했다. 함께 온 지인은 "아니다.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다독였다.
21개월 아이를 품에 안고 덕수궁에 가던 이숙자(39)씨는 "저희 아이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제도를 고치는 게 늘 아쉽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대 조문객들은 같은 또래 친구나 형제·자매 같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데 황망해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휴가 첫날 분향소를 찾은 해병 장성표(25)씨는 "제 또래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며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간호사 정유정(25)씨는 참사 당일 근무 때문에 이태원에 가지 못했다. 그는 "제 또래 친구들이 세월호 사고도 겪었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하고 싶은게 많았겠나"라고 눈물을 훔쳤다.
이어 "통제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2주 전만해도 이태원에서 지구촌 축제가 열렸는데 그땐 아예 차량이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다. 핼러윈 축제로 많인 인파가 예측됐는데도 사고가 나서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발이 성한 노인들도 분향소를 찾아 젊은 넋을 기렸다.
조영순(74)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손자가 살갑게 따르던 형이 참변을 당했다며 헌화 후 한참을 울먹였다.
그는 "그 좁은 데 있다가 죽었으니 어쩌느냐"며 "앞으로는 우리 애들 넓은 곳에서 실컷 놀게 해달라"고 말했다.
조문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벨기에에서 온 에바(39)씨는 참사 당일 이태원에 있었으나 인파를 피하려고 길 건너편에 있었던 덕분에 화를 면했다. 그는 목격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애도를 표하러 왔다고 했다.
에바 씨는 "한국의 이태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젊고 어린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보혜(29)씨도 "국민 대부분이 지하철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이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며 "나 역시 일상에서 걱정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도 국화가 수북이 쌓였다. 시민들은 과자와 초콜릿 같은 간식과 함께 영면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