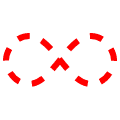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명칭부터 차갑다. 미국에선 이 기관의 약칭 ICE를 철자 그대로 '아이씨이'로 읽지 않고, 차가운 얼음을 뜻하는 '아이스'로 발음한다. ICE는 불법체류자들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2014년 국내 개봉한 영화 <크로싱 오버>는 ICE 요원 '맥스'(해리슨 포드)가 불법체류자들을 체포·추방하는 일을 하면서 겪는 인간적 갈등을 그렸다. 하지만 현실의 ICE는 인정사정없는 단속 기관이다.
2003년 설립된 ICE는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됐다. 이민귀화국과 관세청의 권한을 통합하면서 수사·구금·추방을 한 손에 쥐게 됐다. ICE 산하엔 단속퇴거작전국(ERO)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핵심 축이다. ERO는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고 추방하는 조직이다. HSI는 마약, 사이버범죄, 아동 성매매, 금융 범죄 같은 국제적 범죄를 다룬다. 53개국에 7,100여 명이 파견된 HSI는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수사망이다. 강력한 권한은 그만큼 오남용 소지도 크다. 수용소 여성 불법 자궁 적출 의혹, 시민권자 오인 추방 사건 등과 같은 논란이 잇따른 이유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나 인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덮쳤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구금했다. 단속에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HSI까지 투입됐다.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불법 취업이라는 범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가진 채 현장 근무에 투입한 게 문제가 됐다. 기업으로선 비자 발급 지연과 쿼터 제한 등으로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ICE는 매뉴얼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잡힐 줄 몰랐다"는 지역 정치인의 언급이 살벌했던 단속을 방증한다.
이번 사건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내 최대 투자국 중 하나지만, 전문직 비자 쿼터에선 여전히 뒷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호주·칠레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국가별 비자 할당을 보장받지만, 한국은 빠져 있다. 재계는 오래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E-4) 신설을 요구했으나, 미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미 간 비자 문제에서 제도적 안전판이 부재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사람 문제에선 여전히 동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환기한다.
사정이 어찌 됐든 미국 내에서 '기업 무비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기조 속에 ICE는 불법체류자 문제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냉혹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도 비자 문제를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외교 협상력을 발휘해 '비자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돈 대고 뺨 맞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 차제에 비자 제도 개선과 기업의 자구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합법적 비자 운용과 현지 인력 전략이 없으면 또 다른 현장에서 얼음 같은 ICE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